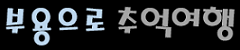닭
페이지 정보

본문
매일 밥상에서 안 빠지는 달걀을 맛있게 먹으며 우리 식구들의 단백질 공급원이라 생각하고 배달되는 통닭도 가끔 즐겨 먹는다
달걀이 먼전지 모르지만 모두 닭에서 나오는 것, 불현듯 그 옛날 소풍 갈때 찐 계란 반찬과 기르던 닭을 잡아서 먹던 닭고기가 생각났다
도시락 반찬으로 찐 계란이 지금보다 더 맛 있었고 닭고기도 시골에서 기른 토종닭 그 맛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당에서 닭을 키우던 그 시절을 그리며 추억에 잠겨본다.
아침 닭장문을 열어 닭들이 마당에 나와 자유롭게 놀수 있게 하였는데 그런 닭들은 놀다가도 가끔씩 말썽을 피우곤 했다
그냥 놔두면 시골 우리집 구석 구석 여기저기를 돌아 다니며 지렁이, 땅강아지 같은 벌레를 잡아 먹고 풀도 뜯어 먹으며 마음대로 놀수 있었으며 부드러운 흙밭을 파고 앉아서 헤집고 놀기를 좋아했다
때로 마루에 올라와 달기똥을 싸 놓기라도 하면 그땐 물걸레로 박박 문질러 깨끗히 지워야 했는데 달기똥 냄새가 느끼하고 굉장히 고약스러웠기 때문이다
또한 텃밭에서 무거운 흙덩이를 힘겹게 밀고 올라오는 예쁜 어린 콩의 싹을 콕콕 찍어 먹거나, 하지 감자밭에서 제 보금자리처럼 둥글고 깊게 파놓고 그 안에 앉아 발로 흙을 마구 헤집으며 노는 녀석들 . .
농사철에는 시암에 갈때 텃밭쪽에 작은 문을 만들어 놓고 닫으며 들락 거려야 했다
그래도 대문없는 우리 집에서 나가지 않고 장닭의 지휘 아래 놀면서 모시 줄때 '구구' 하고 부르면 안보이는 구석진 곳에서 종종거리며 달려 나오곤 했다
잠자리를 많이 잡으면 먹이로 갔다 주었는데 엄청 좋아하면서 서로 먼저 먹으려고 난리 부르스를 췄었고 한쪽에서 쥐나 뱀 등을 발견하면 겁이 많아선지 일제히 '꼭 꼭 꼭 꼭' 소리를 지르며 시끄럽게 야단 법석을 피우곤 했다
탱자나무 울타리 아래 틈이 많아 그곳으로 나가 이웃집 밭에서 놀기도 했는데 하루는 닭장에 다시 가두려고 저녁 모이를 주면서 '구구구구' 불러 보니 한마리가 부족하다
없어진 닭을 찾아서 동네 방네를 어두어 질 때까지 뒤져도 찾을 수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 한집 건너 일곤 형네 캄캄한 닭장안 횟대 위에 그집 닭들 사이에서 사이좋게 앉아 있었다
매일 모이 주면서 보기 때문에 주황색으로 알록달록한 우리 닭을 금방 알수 있었고 닭이 여럿이 나란히 앉아있는 데도 우리 닭을 쉽게 구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장닭이 자기 수하의 닭들을 잘 간수하지 못한 책임이 매우 크다
장닭은 일단 덩치가 더 크고 머리 위에 새빨간 벼슬로 위용을 자랑하면서 빨강, 검정, 주황색 등으로 치장한 털 색깔은 화려하여 금방 눈에 띄고 암닭과는 확연히 구별 되었다
보통 휘하 여닐곱 마리의 암탉들을 데리고 다니며 관리하면서 때로 맛있는 먹이를 발견하면 먼저 먹지 않고 '구구구구' 하고 소리를 질러서 암탉들이 쫒아오면 함께 먹곤 하였다
말 듣지않는 암탉이 있으면 옆에서 한쪽 날개를 높히 펼쳐들고 '꼬꼬꼬꼬~ ' 소리 지르면서 깨금발로 암탉 주위를 빙빙 돌며 위협하는 것과 부리로 암탉 벼슬을 콕 물고서 위에 올라 타는 것을 가끔 볼 수 있었다
새벽 동이 트기 시작하면 장닭은 횟대에서 '꼭끼 요우 ~' 매번 우렁찬 목소리로 울어 대면서 우리들에게 그만 일어 나라고 매일 닭장 안에서 외쳐 댔었다
또한 장닭이 두마리 이상이면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며 약한 놈을 못살게 굴기도 하였지만 서로 지지 않으려고 가끔 치열하여 피나게 싸우기도 하지만 우리들은 말리지 않고 재미있다고 옆에서 그냥 지켜 보기만 했다
암탉은 밝에서 놀다가 알을 낳을때 쯤이면 닭장 우리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가 지푸락으로 예쁘게 짜 놓은 둥우리에 올라가서 알을 낳았는데 하루에 하나씩 낳는것 같다
그러나 때로 게으른 닭은 모래밭에서 놀다 거기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짚눌 위 틈바귀에 들어가서 몰래 낳거나, 부엌 지붕 위 높은 곳에까지 올라가서 그 틈에 알을 낳기도 했는데 잘 관찰하여 알을 찾아 와야 했었다
알을 낳고 나서는 암탉은 '꼬꼬댁 - 꼭꼭 -' 하고 울면서 표시를 하여 또 낳았는가 보다 하고 알을 찾으러 갈 수 있었고, 알들을 내다가 팔아서 학용품 등을 사는데 매우 유용하게 이용하였다
낳은 알을 잘 보관 했다가 닭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때가 되면 알을 10 개 정도 둥지에 올려 넣어두면 암탉이 와서 자리잡고 앉아 그 알들을 품었다
그 뒤로는 암탉이 둥지에서 꼼짝않고 알들을 품고 앉아서 나오질 않았는데 책임감인지 강한 모성애인지 오랫동안 끈질기게 가만히 그자리에 앉아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품고있는 닭을 배려하여 먹이나 물 등을 가까운데에 준비해 놓았으나 그것도 잘 먹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나 가끔 한번씩 둥지를 벗어나서 밖으로 나왔다
꼼짝않고 있는게 너무 지루하여서 인지 물을 먹고 잠시 쉬기 위해선지 모르지만, 그걸 지켜보는 우리들은 품던 알이 식고 곯으면 병아리가 깨어나지 않을까봐 걱정되어 시간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 닭의 눈치를 살피며 마음을 졸였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나와서 땅을 쪼거나 딴짓거리를 하는 것을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닭 대신 내가 들어가 앉아 있을 수도 없으니까 . .
그러나 얼마가 지난 뒤 다시 둥지에 올라가서 품었다
암탉이 그대로 앉아서 약 20 일쯤 지나면 알을 품고있는 둥우리에서 '삐약'하고 작은 병아리 소리가 들리는데 암닭 날개 사이에서 작고 예쁜 병아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 병아리가 깨기 시작하지만 닭의 날개 품 아래에 몇마리가 숨어 있어 나오지 않아 잘 보이지가 않는다
몇마리가 깨어났나 궁금하기도 하고 계속 품고 있어도 깨어나지 않는 곯은 달걀을 계속 품고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깨어난 계란 껍질을 제거하면서 병아리 숫자를 확인하려고 손을 밑으로 집어 넣으려 하면 암탉은 '꼭꼭' 소리내며 성을 내면서 내 손을 부리로 콕콕 쪼기도 했다
그럼에도 계란이 모두 산란 되었는지 확인한 뒤에 에미닭과 귀여운 병아리를 함께 데려다 마당 한쪽 구분하는 별도의 장소에 작은 울타리를 만들어 장닭이나 다른 암탉 또는 강아지들이 해치지 못하게 하고 먹이와 물을 넣어 주었었다
노랗게 예쁘고 앙증맞은 병아리가 물 한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고 하는 것이 귀여워서 사알짝 건드려 볼려고 하면 에미닭이 어느새 쭈루루 달려와 닭 부리로 쪼을려고 하여 후딱 손을 빼지만 그래도 몰래 살짝 한마리를 데려다가 동생과 함께 마루 위에 올려 놓고 노오란 병아리 털을 쓰다듬기도 하고 조그만 부리와 작은 발가락을 만지작 만지작 . .
병아리는 밖에서 어미 주위에 졸졸 따라 다니며 놀다가도 비가 오거나 바람이 조금 세게 불면 어미닭 날개 품속으로 삐집고 들어가버려 한마리도 보이지 않고 잘잘한 작은 다리들만 여러개가 사알짝 엿 보였었다
그렇게 예쁜 병아리들도 자라면서 털이 빠지고 털갈이를 하며 색깔이 변하면서 불품없이 되다가 금방 큰 닭이 되어간다
귀한 손님이나 사위한테 대접 한다던 씨암닭은 그때 우리들에게도 최고의 음식이었었다
손님 접대 할 일이 있을때면 어린 나한테 닭을 잡아 오라고 시켰었는데 마당에 놀고 있는 닭을 쉽게 잡을 수 있으려니 여겼지만 번번히 허탕치기 일수였다
꽤 날쌔게 도망가기도 하고 날개가 있어 날아서 담위에 잽싸게 오르고 때로는 지붕 위에도 올라가 버리면 잡기가 어려우므로 닭장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잡는 것이 쉬운것 같다
처음에는 멋 모르고 닭장 안에 들어가서 잡으려다 놓쳐서 닭장 안이 발칵 뒤집혔었는데 나중에는 밤에 슬며시 들어가 앉아서 자고 있는 것을 사알짝 보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었다
겁이 많아 하지 못하던 닭 모가지 비트는 일도 나중에는 아예 내몫으로 되어 버렸다
그때는 닭을 푹 삶아서 식구들이 나눠 먹는 것이 당시 시골에서의 최고의 진수성찬 이었으니까
삶은 닭 한마리를 일곱 식구가 나눠 먹는데 가끔 닭다리 하나를 차지할수 있을 때면 그렇게 기분 좋을 수 없었기도 했었지
우리가 젊었을 때는 튀김 통닭으로서 놓아 기르는 토종닭을 먹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마 요즘의 토종닭과는 많이 다르리라고 생각한다
마당에서 지 마음대로 돌아 다니며 고자리나 굼벵이들도 잡아 먹고 온갖 풀과 곡식들을 먹을 수 있으며 기분좋게 놀던 닭들은 사료만 먹고 일정한 공간에서 자라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으리라
80년대초 군산 개복동 통닭집에서 느꼈던 그러한 토종닭의 기가막힌 맛 !
첫째를 임신하고 입덧이 극심해 그냥 토하기만 했던 아내가 통닭 한마리를 거뜬히 해치우며(?) 너무나 맛있어 했던 그 기억을 지금도 가끔 떠오르며 아내와 함께 잊지못할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달걀이 먼전지 모르지만 모두 닭에서 나오는 것, 불현듯 그 옛날 소풍 갈때 찐 계란 반찬과 기르던 닭을 잡아서 먹던 닭고기가 생각났다
도시락 반찬으로 찐 계란이 지금보다 더 맛 있었고 닭고기도 시골에서 기른 토종닭 그 맛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당에서 닭을 키우던 그 시절을 그리며 추억에 잠겨본다.
아침 닭장문을 열어 닭들이 마당에 나와 자유롭게 놀수 있게 하였는데 그런 닭들은 놀다가도 가끔씩 말썽을 피우곤 했다
그냥 놔두면 시골 우리집 구석 구석 여기저기를 돌아 다니며 지렁이, 땅강아지 같은 벌레를 잡아 먹고 풀도 뜯어 먹으며 마음대로 놀수 있었으며 부드러운 흙밭을 파고 앉아서 헤집고 놀기를 좋아했다
때로 마루에 올라와 달기똥을 싸 놓기라도 하면 그땐 물걸레로 박박 문질러 깨끗히 지워야 했는데 달기똥 냄새가 느끼하고 굉장히 고약스러웠기 때문이다
또한 텃밭에서 무거운 흙덩이를 힘겹게 밀고 올라오는 예쁜 어린 콩의 싹을 콕콕 찍어 먹거나, 하지 감자밭에서 제 보금자리처럼 둥글고 깊게 파놓고 그 안에 앉아 발로 흙을 마구 헤집으며 노는 녀석들 . .
농사철에는 시암에 갈때 텃밭쪽에 작은 문을 만들어 놓고 닫으며 들락 거려야 했다
그래도 대문없는 우리 집에서 나가지 않고 장닭의 지휘 아래 놀면서 모시 줄때 '구구' 하고 부르면 안보이는 구석진 곳에서 종종거리며 달려 나오곤 했다
잠자리를 많이 잡으면 먹이로 갔다 주었는데 엄청 좋아하면서 서로 먼저 먹으려고 난리 부르스를 췄었고 한쪽에서 쥐나 뱀 등을 발견하면 겁이 많아선지 일제히 '꼭 꼭 꼭 꼭' 소리를 지르며 시끄럽게 야단 법석을 피우곤 했다
탱자나무 울타리 아래 틈이 많아 그곳으로 나가 이웃집 밭에서 놀기도 했는데 하루는 닭장에 다시 가두려고 저녁 모이를 주면서 '구구구구' 불러 보니 한마리가 부족하다
없어진 닭을 찾아서 동네 방네를 어두어 질 때까지 뒤져도 찾을 수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 한집 건너 일곤 형네 캄캄한 닭장안 횟대 위에 그집 닭들 사이에서 사이좋게 앉아 있었다
매일 모이 주면서 보기 때문에 주황색으로 알록달록한 우리 닭을 금방 알수 있었고 닭이 여럿이 나란히 앉아있는 데도 우리 닭을 쉽게 구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장닭이 자기 수하의 닭들을 잘 간수하지 못한 책임이 매우 크다
장닭은 일단 덩치가 더 크고 머리 위에 새빨간 벼슬로 위용을 자랑하면서 빨강, 검정, 주황색 등으로 치장한 털 색깔은 화려하여 금방 눈에 띄고 암닭과는 확연히 구별 되었다
보통 휘하 여닐곱 마리의 암탉들을 데리고 다니며 관리하면서 때로 맛있는 먹이를 발견하면 먼저 먹지 않고 '구구구구' 하고 소리를 질러서 암탉들이 쫒아오면 함께 먹곤 하였다
말 듣지않는 암탉이 있으면 옆에서 한쪽 날개를 높히 펼쳐들고 '꼬꼬꼬꼬~ ' 소리 지르면서 깨금발로 암탉 주위를 빙빙 돌며 위협하는 것과 부리로 암탉 벼슬을 콕 물고서 위에 올라 타는 것을 가끔 볼 수 있었다
새벽 동이 트기 시작하면 장닭은 횟대에서 '꼭끼 요우 ~' 매번 우렁찬 목소리로 울어 대면서 우리들에게 그만 일어 나라고 매일 닭장 안에서 외쳐 댔었다
또한 장닭이 두마리 이상이면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며 약한 놈을 못살게 굴기도 하였지만 서로 지지 않으려고 가끔 치열하여 피나게 싸우기도 하지만 우리들은 말리지 않고 재미있다고 옆에서 그냥 지켜 보기만 했다
암탉은 밝에서 놀다가 알을 낳을때 쯤이면 닭장 우리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가 지푸락으로 예쁘게 짜 놓은 둥우리에 올라가서 알을 낳았는데 하루에 하나씩 낳는것 같다
그러나 때로 게으른 닭은 모래밭에서 놀다 거기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짚눌 위 틈바귀에 들어가서 몰래 낳거나, 부엌 지붕 위 높은 곳에까지 올라가서 그 틈에 알을 낳기도 했는데 잘 관찰하여 알을 찾아 와야 했었다
알을 낳고 나서는 암탉은 '꼬꼬댁 - 꼭꼭 -' 하고 울면서 표시를 하여 또 낳았는가 보다 하고 알을 찾으러 갈 수 있었고, 알들을 내다가 팔아서 학용품 등을 사는데 매우 유용하게 이용하였다
낳은 알을 잘 보관 했다가 닭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때가 되면 알을 10 개 정도 둥지에 올려 넣어두면 암탉이 와서 자리잡고 앉아 그 알들을 품었다
그 뒤로는 암탉이 둥지에서 꼼짝않고 알들을 품고 앉아서 나오질 않았는데 책임감인지 강한 모성애인지 오랫동안 끈질기게 가만히 그자리에 앉아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품고있는 닭을 배려하여 먹이나 물 등을 가까운데에 준비해 놓았으나 그것도 잘 먹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나 가끔 한번씩 둥지를 벗어나서 밖으로 나왔다
꼼짝않고 있는게 너무 지루하여서 인지 물을 먹고 잠시 쉬기 위해선지 모르지만, 그걸 지켜보는 우리들은 품던 알이 식고 곯으면 병아리가 깨어나지 않을까봐 걱정되어 시간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 닭의 눈치를 살피며 마음을 졸였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나와서 땅을 쪼거나 딴짓거리를 하는 것을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닭 대신 내가 들어가 앉아 있을 수도 없으니까 . .
그러나 얼마가 지난 뒤 다시 둥지에 올라가서 품었다
암탉이 그대로 앉아서 약 20 일쯤 지나면 알을 품고있는 둥우리에서 '삐약'하고 작은 병아리 소리가 들리는데 암닭 날개 사이에서 작고 예쁜 병아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 병아리가 깨기 시작하지만 닭의 날개 품 아래에 몇마리가 숨어 있어 나오지 않아 잘 보이지가 않는다
몇마리가 깨어났나 궁금하기도 하고 계속 품고 있어도 깨어나지 않는 곯은 달걀을 계속 품고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깨어난 계란 껍질을 제거하면서 병아리 숫자를 확인하려고 손을 밑으로 집어 넣으려 하면 암탉은 '꼭꼭' 소리내며 성을 내면서 내 손을 부리로 콕콕 쪼기도 했다
그럼에도 계란이 모두 산란 되었는지 확인한 뒤에 에미닭과 귀여운 병아리를 함께 데려다 마당 한쪽 구분하는 별도의 장소에 작은 울타리를 만들어 장닭이나 다른 암탉 또는 강아지들이 해치지 못하게 하고 먹이와 물을 넣어 주었었다
노랗게 예쁘고 앙증맞은 병아리가 물 한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고 하는 것이 귀여워서 사알짝 건드려 볼려고 하면 에미닭이 어느새 쭈루루 달려와 닭 부리로 쪼을려고 하여 후딱 손을 빼지만 그래도 몰래 살짝 한마리를 데려다가 동생과 함께 마루 위에 올려 놓고 노오란 병아리 털을 쓰다듬기도 하고 조그만 부리와 작은 발가락을 만지작 만지작 . .
병아리는 밖에서 어미 주위에 졸졸 따라 다니며 놀다가도 비가 오거나 바람이 조금 세게 불면 어미닭 날개 품속으로 삐집고 들어가버려 한마리도 보이지 않고 잘잘한 작은 다리들만 여러개가 사알짝 엿 보였었다
그렇게 예쁜 병아리들도 자라면서 털이 빠지고 털갈이를 하며 색깔이 변하면서 불품없이 되다가 금방 큰 닭이 되어간다
귀한 손님이나 사위한테 대접 한다던 씨암닭은 그때 우리들에게도 최고의 음식이었었다
손님 접대 할 일이 있을때면 어린 나한테 닭을 잡아 오라고 시켰었는데 마당에 놀고 있는 닭을 쉽게 잡을 수 있으려니 여겼지만 번번히 허탕치기 일수였다
꽤 날쌔게 도망가기도 하고 날개가 있어 날아서 담위에 잽싸게 오르고 때로는 지붕 위에도 올라가 버리면 잡기가 어려우므로 닭장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잡는 것이 쉬운것 같다
처음에는 멋 모르고 닭장 안에 들어가서 잡으려다 놓쳐서 닭장 안이 발칵 뒤집혔었는데 나중에는 밤에 슬며시 들어가 앉아서 자고 있는 것을 사알짝 보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었다
겁이 많아 하지 못하던 닭 모가지 비트는 일도 나중에는 아예 내몫으로 되어 버렸다
그때는 닭을 푹 삶아서 식구들이 나눠 먹는 것이 당시 시골에서의 최고의 진수성찬 이었으니까
삶은 닭 한마리를 일곱 식구가 나눠 먹는데 가끔 닭다리 하나를 차지할수 있을 때면 그렇게 기분 좋을 수 없었기도 했었지
우리가 젊었을 때는 튀김 통닭으로서 놓아 기르는 토종닭을 먹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마 요즘의 토종닭과는 많이 다르리라고 생각한다
마당에서 지 마음대로 돌아 다니며 고자리나 굼벵이들도 잡아 먹고 온갖 풀과 곡식들을 먹을 수 있으며 기분좋게 놀던 닭들은 사료만 먹고 일정한 공간에서 자라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으리라
80년대초 군산 개복동 통닭집에서 느꼈던 그러한 토종닭의 기가막힌 맛 !
첫째를 임신하고 입덧이 극심해 그냥 토하기만 했던 아내가 통닭 한마리를 거뜬히 해치우며(?) 너무나 맛있어 했던 그 기억을 지금도 가끔 떠오르며 아내와 함께 잊지못할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