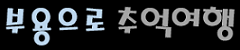우물의 추억
페이지 정보

본문
○ 우물의 추억
우물(시암) 안을 들여다 보면 저 아래 동그란 원 안에 푸른하늘 흰구름이 두둥실 그 앞에 쳐다보고 있는 내 모습이 보였다
매번 두름박(두레박)을 내리기 전 고요한 수면에 반사되어 비치는 우물 속 내 모습을 힐끗 쳐다 보곤 했다
두레박 올리면서 노깡벽 안쪽에 중간 이음매에도 파란 이끼를 볼 수 있어 우리 우물이 꽤 오래 되었네 하고 생각했다
텃밭 가운데 지붕없는 우물은 비 오면 빗물도 우물물이 되고, 비가 많이 올때 물을 풀려면 한손에 우산 잡은채 두레박 줄을 올려야 하는데 가득한 두레박을 다른 한손으로 들어 올릴 수 없지만 그래도 올려야 했다
두레박은 함석을 반원으로 구부려 양쪽 판과 위 중간에 가로 막대로 고정하고 손잡이를 박아 만들었다
지푸락으로 튼튼하게 꼰 새끼로 두레박 줄을 만들었으며 손바닥들에 시달려 두레박 줄도 점점 닳아 반들반들 해졌다
겨울에 두레박 새끼줄이 얼어붙어 끊어지기도 했다
닳아서 끊어지거나 두레박 줄을 놓쳐 버리면 새끼줄에 쇠고리 달아 우물에서 두레박 낛시질을 했다
우리 뒷집은 우리집에서 퍼갔다
보통은 수대로 물을 나르는데 물양동이 지게를 가져와서 몽땅씩 퍼 짊어지고 가기도 했으며, 우리집 마당을 가로질러 다니지만 항상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었고 뭐라는 사람도 없는 당연하고도 넉넉한 시골 민심이다
자꾸 퍼내지만 우물 물은 그대로 고여있으니 물은 돈을 받고 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당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다
지금은 양동이라 부르는 수대는 바께스라고도 했으며 함석으로 만들고 두꺼운 철사를 휘어 손잡이용 나무를 넣어 그 손잡이를 잡고 들어 올렸다
가끔 손잡이 작은 나무도 깨져 없어지면 두꺼운 철사줄을 그냥 잡을수 밖에 없으나 어린 고사리 손에 잘 안 잡혀 힘들었으며 또한 수대 가득 약 15 리터, 15 kg 짜리를 들고 나르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점점 자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수대가 가벼워졌다
두레박은 들어 올릴때 마다 매번 힘들고 귀찮았지만 물을 풀려면 할수 없는데 지붕과 가로지른 나무에 도르래를 달아 줄을 잡아 당길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으나 그저 꿈으로 그쳤다
그래도 다른집에 비하여 우리집 안에 가까이 우물이 있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것은 그렇게 깊지는 않았고 다른집이나 학교 우물은 밑의 저 끝 수면이 보일락 말락 까마득해서 우물에서 물을 풀려면 줄을 잡고 들어 올리면서 한참이나 실갱이 해야하고 다 올리기까지 기다리기도 지루할 정도였다
동네에 대개 공동우물이 하나, 둘 있었다
동네 옆 큰부대 초교동창 창순네집 가까이와 수룡구지 기백이집 앞, 그리고 우리동네의 펄시암 방죽 앞에도 공동 우물이 있었는데 방죽에서 낛시하다 보면 그 펄시암에는 멀리 떨어진 작은 부대에서도 아줌마들이 빨랫감을 머리에 이고 빨래하러 왔으며 그중에는 학교당 삼거리 사는 후배 이쁜이 혜실이도 가끔 보였다
펄시암은 얕아 두레박 줄을 3번만 들어 올리면 물을 퍼올릴 수 있어 쉬웠고 천천히 마음놓고 모처럼 동네사람도 만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수도 있어 휴일이면 많이들 이용했다
우물로서 작두샘이 있는 집도 한 둘 있었으나 바가지로 마중물을 넣어야 물이 올라왔고 오래 사용하지 않은 곳에서 손잡이를 누르고 올리는 헛심만 들어가면서 물올리기를 실패한 적도 있었다
남들은 물양동이 지게로 지고 나르는데 우리는 부엌이 가까워 그냥 수대만 이용해서 양동이 지게를 질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크면서 물지게와 똑같이 생긴 오줌통 지게를 아버지가 내게 지게하셨다
물동이는 함석으로 만들지만 똥오줌 지게용 통은 나무로 만들었다
쉬웁게 보여 일단 빈통을 양쪽 고리에 거는 지게를 지어보고 시험해 본 다음 오줌을 퍼 담은 통을 지겟줄을 어깨에 걸고 불끈 일어서 보려는데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
다리에 힘을 잔뜩 주어 어떻게 간신히 일어서긴 했는데 통이 조금만 흔들리면 다른 쪽에 영향 미쳐 함께 출렁이고 시계 추같이 좌우로 왔다 갔다하여 중심을 잡기가 어려웠으며 다리가 후들후들, 그렇게 출렁이다 넘치거나 만약 자빠지기라도 한다면 그야말로 온통 오줌 범벅으로 될것은 뻔하였기 때문에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게 똥지게라며는 더할나위 없었겠지만 . .
그렇게 물통을 지고 나르는 많은 사람의 일이 쉽게 보였었는데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이 많이 드는지를 깨달았다
그래도 아버지가 그런 일은 거의 다 하셔서 나는 오줌, 똥지게를 그 뒤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져볼 기회가 없었다
당시 양동이 물지게는 주로 남자들의 일이었고 물을 많이 쓰는 여자들은 주로 수대를 한손으로 또는 양쪽으로 들어 날랐다
멀리 갈때는 수건을 동그랗게 말아서 또는 지푸락으로 또아리를 만들어 머리 위에 얹혀 놓고 수대를 이고 이마에 땀과 함께 흐르는 물을 손으로 저어 닦으며 나르곤 했었다
우리집 우물가는 넓적한 돌들이 여기저기 깔려있고 빨래판 같은 넓은 돌판과 한쪽에는 밑에 든든하게 받쳐놓은 확독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물맛이 좋아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릴 때는 두레박채로 우물 물을 그냥 물컥물컥 들이 마셨으며, 한여름에는 누나가 두레박으로 물을 퍼서 옆드려 있는 내 등에 물을 쫙 끼얹으면 어후후 하고 시원하게 등목을 하고 캄캄한 밤에는 모르게 혼자서 또는 어머니와 누나도 멱을 감기도 했다
어느샌가 우물 곁에 갈 수가 없게 되었으며 그저 꼭지만 비틀면 콸콸 쏟아지는 물이 나오고 그냥 먹으면 약간 비린 약 냄새가 나며 정수하거나 끓여야 먹어야 하는 수돗물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우물이 있던 우리 고향은 이제 먼 김제에서 보내주는 수돗물을 쓰고 있으며 그 편리함에 의해 우물에서 퍼서 올리고 나르고 또 보관해야 했던 일들은 먼 나라 달나라 이야기로 되어 버린것 같다
고인 물은 썩는다고 하는데 시골에 아직 우물이 살아있는 곳이 있을까요 ?
우물(시암) 안을 들여다 보면 저 아래 동그란 원 안에 푸른하늘 흰구름이 두둥실 그 앞에 쳐다보고 있는 내 모습이 보였다
매번 두름박(두레박)을 내리기 전 고요한 수면에 반사되어 비치는 우물 속 내 모습을 힐끗 쳐다 보곤 했다
두레박 올리면서 노깡벽 안쪽에 중간 이음매에도 파란 이끼를 볼 수 있어 우리 우물이 꽤 오래 되었네 하고 생각했다
텃밭 가운데 지붕없는 우물은 비 오면 빗물도 우물물이 되고, 비가 많이 올때 물을 풀려면 한손에 우산 잡은채 두레박 줄을 올려야 하는데 가득한 두레박을 다른 한손으로 들어 올릴 수 없지만 그래도 올려야 했다
두레박은 함석을 반원으로 구부려 양쪽 판과 위 중간에 가로 막대로 고정하고 손잡이를 박아 만들었다
지푸락으로 튼튼하게 꼰 새끼로 두레박 줄을 만들었으며 손바닥들에 시달려 두레박 줄도 점점 닳아 반들반들 해졌다
겨울에 두레박 새끼줄이 얼어붙어 끊어지기도 했다
닳아서 끊어지거나 두레박 줄을 놓쳐 버리면 새끼줄에 쇠고리 달아 우물에서 두레박 낛시질을 했다
우리 뒷집은 우리집에서 퍼갔다
보통은 수대로 물을 나르는데 물양동이 지게를 가져와서 몽땅씩 퍼 짊어지고 가기도 했으며, 우리집 마당을 가로질러 다니지만 항상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었고 뭐라는 사람도 없는 당연하고도 넉넉한 시골 민심이다
자꾸 퍼내지만 우물 물은 그대로 고여있으니 물은 돈을 받고 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당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다
지금은 양동이라 부르는 수대는 바께스라고도 했으며 함석으로 만들고 두꺼운 철사를 휘어 손잡이용 나무를 넣어 그 손잡이를 잡고 들어 올렸다
가끔 손잡이 작은 나무도 깨져 없어지면 두꺼운 철사줄을 그냥 잡을수 밖에 없으나 어린 고사리 손에 잘 안 잡혀 힘들었으며 또한 수대 가득 약 15 리터, 15 kg 짜리를 들고 나르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점점 자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수대가 가벼워졌다
두레박은 들어 올릴때 마다 매번 힘들고 귀찮았지만 물을 풀려면 할수 없는데 지붕과 가로지른 나무에 도르래를 달아 줄을 잡아 당길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으나 그저 꿈으로 그쳤다
그래도 다른집에 비하여 우리집 안에 가까이 우물이 있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것은 그렇게 깊지는 않았고 다른집이나 학교 우물은 밑의 저 끝 수면이 보일락 말락 까마득해서 우물에서 물을 풀려면 줄을 잡고 들어 올리면서 한참이나 실갱이 해야하고 다 올리기까지 기다리기도 지루할 정도였다
동네에 대개 공동우물이 하나, 둘 있었다
동네 옆 큰부대 초교동창 창순네집 가까이와 수룡구지 기백이집 앞, 그리고 우리동네의 펄시암 방죽 앞에도 공동 우물이 있었는데 방죽에서 낛시하다 보면 그 펄시암에는 멀리 떨어진 작은 부대에서도 아줌마들이 빨랫감을 머리에 이고 빨래하러 왔으며 그중에는 학교당 삼거리 사는 후배 이쁜이 혜실이도 가끔 보였다
펄시암은 얕아 두레박 줄을 3번만 들어 올리면 물을 퍼올릴 수 있어 쉬웠고 천천히 마음놓고 모처럼 동네사람도 만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수도 있어 휴일이면 많이들 이용했다
우물로서 작두샘이 있는 집도 한 둘 있었으나 바가지로 마중물을 넣어야 물이 올라왔고 오래 사용하지 않은 곳에서 손잡이를 누르고 올리는 헛심만 들어가면서 물올리기를 실패한 적도 있었다
남들은 물양동이 지게로 지고 나르는데 우리는 부엌이 가까워 그냥 수대만 이용해서 양동이 지게를 질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크면서 물지게와 똑같이 생긴 오줌통 지게를 아버지가 내게 지게하셨다
물동이는 함석으로 만들지만 똥오줌 지게용 통은 나무로 만들었다
쉬웁게 보여 일단 빈통을 양쪽 고리에 거는 지게를 지어보고 시험해 본 다음 오줌을 퍼 담은 통을 지겟줄을 어깨에 걸고 불끈 일어서 보려는데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
다리에 힘을 잔뜩 주어 어떻게 간신히 일어서긴 했는데 통이 조금만 흔들리면 다른 쪽에 영향 미쳐 함께 출렁이고 시계 추같이 좌우로 왔다 갔다하여 중심을 잡기가 어려웠으며 다리가 후들후들, 그렇게 출렁이다 넘치거나 만약 자빠지기라도 한다면 그야말로 온통 오줌 범벅으로 될것은 뻔하였기 때문에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게 똥지게라며는 더할나위 없었겠지만 . .
그렇게 물통을 지고 나르는 많은 사람의 일이 쉽게 보였었는데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이 많이 드는지를 깨달았다
그래도 아버지가 그런 일은 거의 다 하셔서 나는 오줌, 똥지게를 그 뒤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져볼 기회가 없었다
당시 양동이 물지게는 주로 남자들의 일이었고 물을 많이 쓰는 여자들은 주로 수대를 한손으로 또는 양쪽으로 들어 날랐다
멀리 갈때는 수건을 동그랗게 말아서 또는 지푸락으로 또아리를 만들어 머리 위에 얹혀 놓고 수대를 이고 이마에 땀과 함께 흐르는 물을 손으로 저어 닦으며 나르곤 했었다
우리집 우물가는 넓적한 돌들이 여기저기 깔려있고 빨래판 같은 넓은 돌판과 한쪽에는 밑에 든든하게 받쳐놓은 확독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물맛이 좋아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릴 때는 두레박채로 우물 물을 그냥 물컥물컥 들이 마셨으며, 한여름에는 누나가 두레박으로 물을 퍼서 옆드려 있는 내 등에 물을 쫙 끼얹으면 어후후 하고 시원하게 등목을 하고 캄캄한 밤에는 모르게 혼자서 또는 어머니와 누나도 멱을 감기도 했다
어느샌가 우물 곁에 갈 수가 없게 되었으며 그저 꼭지만 비틀면 콸콸 쏟아지는 물이 나오고 그냥 먹으면 약간 비린 약 냄새가 나며 정수하거나 끓여야 먹어야 하는 수돗물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우물이 있던 우리 고향은 이제 먼 김제에서 보내주는 수돗물을 쓰고 있으며 그 편리함에 의해 우물에서 퍼서 올리고 나르고 또 보관해야 했던 일들은 먼 나라 달나라 이야기로 되어 버린것 같다
고인 물은 썩는다고 하는데 시골에 아직 우물이 살아있는 곳이 있을까요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