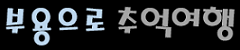우리동네
페이지 정보

본문
○ 우리동네
다섯살 먹었던 녀석이 오늘 아침 "이제는 여섯살이 되었어요" 하고 신이 나서 전화했다
나도 그렇게 좋아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하며 다들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그 시절로 돌아가 어릴 때 살았던 우리 동네를 회상하며 더듬어 보려고 한다
우리 동네를 장터라고 불렀다
동네 한바퀴 빙 도는 골목길 안쪽의 밭이 옛날에 장터였던 곳으로 보인다
그 터는 탱자나무로 막은 밭이 절반 차지하고 나머지 절반은 그냥 보리밭이었는데 농사를 마치면 아이들 모두들 뛰어놀기 좋은 곧 동네 운동장으로 되었다
그곳마저 나중에 집이 지어졌고 교회를 비롯하여 몇채의 건물이 세워졌으니 아마 그때가 시골 부용이 한창때였지 않았나 생각한다
동네는 항상 시끌벅적 했었는데 장터 주위에 사는 친구들이 모두 나와 다져진 밭과 골목 길에서 자치기, 딱지치기, 구슬치기 하느라 조용할 날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옆집 낙희, 영순, 영준, 영숙, 영식 또 반대쪽 집 맹순, 순근, 정근, 옥근, 점근, 점순 우리 집 다섯 남매와 부모를 합치면 세 초가집만 하여도 22명이 살았다
그때는 동네 대부분이 한 집에 일곱, 여덟식구 였었으니까 . .
그 근방 동네 애들을 합하면 금방 50 ~ 60명이 되며 집안에서는 다른 마땅한 놀이가 없었을 때였다
동생이 태어나면 등에 업어 키우고, 손잡고 데리고 다니며 함께 놀아주고, 커서 학생이 되면 벌어서 학비도 대주었다
바야흐로 세월이 흘러 이제 보통 자녀수가 5~10명이 2명으로, 졸업할 때 6학년 135명이던 초등학교가 학생 전부가 21명으로 쪼그라 들었으며 시골 부용이 약국조차 없는 곳으로 변해버렸다
장이 섰을 때 동네 장터에서 물건을 팔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집의 기억들이 떠오른다
한쪽 탱자나무길로 조금 들어가면 두부장수 집이 있었다
집에서 두부를 빚어 동네를 돌아 다니며 팔았던 아저씨는 옛날 두부장수 모습으로 한쪽 어깨에 기다란 막대기를 메고 막대 앞, 뒤 끝에 끈으로 매달은 넓적한 상자판에 두부를 담아 땡그렁 땡그렁 손 종을 울리면서 여러 동네를 돌아 다녔었다
그 두부장수 아저씨 한손이 주먹손 이었기 때문에 근방 사람들은 누군지 쉽게 알아 볼 것이라 생각한다
긴 막대 끝에 늘어뜨린 두부판을 어깨에 지고 다니니 꽤 힘이 들었을텐데 다 팔기 위하여 손종을 울리면서 부용 관내와 조금 먼 공덕면 황산까지도 갔었다고 한다
두부를 만들때 나오는 비지는 그냥 버렸는데 우리는 가끔 그 비지를 받아와 돼지 밥을 줬으며 국을 만들어 먹기도 하였고 멀국이 꽤 맛있었다
우리 동네에는 두부 만드는 집이 한곳 더 있었으며 언젠가 부터 그런 모습으로 어깨 위에 짊어지고 물건을 팔러 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찾아 볼 수가 없다
두부장수 집마당을 지나서 더 들어가면 신작로에서 고기 판매를 하며 돼지를 집에서 잡는 집이 있었다
집 입구 노천 부위가 돼지잡는 장소로 돼지를 잡는 날이면 지르는 꽥 - 꽥 소리가 동네에 울려 퍼지고 우리집까지 들려왔다
그집 둘째 아들이 동네 골목대장이며 남매로 오복, 오봉, 옥주, 옥련이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누나 동창으로 친구였고 어릴 때 나도 그집 식구와 함께 놀았으며 약간 어두운 그집 방안에 들어 간 기억이 나는것으로 보아 아마 새배드리러 간 것 같다
돼지를 잡고 있을 때는 "돼지 멱 따는 소리"라고 하는 그 소리가 온 동네를 떠들석하게 했어도 동네 사람 누구도 시끄럽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
신작로에서 고기장사를 하려고 잡는 것이며 그 집 형제들은 덩치가 크고 억세며 마음씨는 좋았으나 좀 사나운 인상을 주는 그집 어머니한테 누구도 대들지는 못한것 같다
돼지를 사올 때는 다 커서 엄청나게 큰 돼지를 묶어서 짐 자전거 뒤에 사진처럼 싣고 왔었다
싣고 오는 도중에 계속 꽥꽥 거렸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100근(60kg)이 훨씬 넘는 무거운 돼지를 그냥 조용히 싣고 오는 것을 가끔 보았고 힘이 다빠져서 그러는지 그냥 간헐적으로 "꿀꿀" 소리만 냈다
요즘 같으면 그렇게 자전거에 돼지를 싣고 다니거나, 돼지 잡을 때 나는 꽥꽥 소리는 동물을 학대한다고, 소음 발생으로 진즉 고발되었을 터인데 이제 옛날 이야기로 되어 버렸다
그 당시 돼지를 싣고 다니던 짐 자전거는 앞 핸들 부위를 튼튼하게 보강하여 나중에 150kg 까지 실을 수 있는 것도 만들었다고 하며 주로 쌀집에서 많이 이용하였고 80kg 쌀 두가마니, 아니 세가마니, 이는 어른 세명 이상의 무게도 실을 수 있는 짐꾼들이 있었다고 한다. 믿거나 말거나 . .
또한 주장집에서는 짐 자전거를 막걸리 배달하는데 주로 이용하였으며 뒤에 한번에 술통을 8개를 싣고서 동네 구석을 눈비가 와도 진흙길에서도 달렸었다
오르막 길은 페달을 밟는게 무지막지하게 힘이 들어 내려서 밀고 가야 했는데 힘이 좋고 숙련이 잘된 어른들만이 가능했다
내리막은 브레이크를 꽉 잡은채 조심조심 내려와야 했으며 브레이크 잡는 소리가 삐 - 익, 삑 들려 왔었다
당시 구루마와 함께 짐 자점거는 무거운 것을 실어 나르는데 활약을 많이 했었으며 쌀은 80 kg → 40 kg → 20 kg 단위로, 막걸리는 한통이 한병 작은 단위로 줄어 들고 그와 함께 경운기나 소형 트럭이 대신하면서 부터 짐 자전거는 이제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낙네는 출렁거리는 양철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농부들은 어깨에 나락을 잔뜩 실은 지게를 짊어지고, 술통을 가득 실은 짐 자전거는 수렁길을 이겨내고, 어깨가 아파도 두부가 다 팔릴 때까지 참고, 동네가 멱따는 소리로 소란스러워도 그런 소리를 그냥 참으며 살아 온 인고의 세월이 있었기에 오늘날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들의 어린시절 모습이 호랑이 담배먹던 시절의 이야기가 되었으며 그러면서 모두들 함께 오늘 또 한살 나이를 더 먹는다
다섯살 먹었던 녀석이 오늘 아침 "이제는 여섯살이 되었어요" 하고 신이 나서 전화했다
나도 그렇게 좋아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하며 다들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그 시절로 돌아가 어릴 때 살았던 우리 동네를 회상하며 더듬어 보려고 한다
우리 동네를 장터라고 불렀다
동네 한바퀴 빙 도는 골목길 안쪽의 밭이 옛날에 장터였던 곳으로 보인다
그 터는 탱자나무로 막은 밭이 절반 차지하고 나머지 절반은 그냥 보리밭이었는데 농사를 마치면 아이들 모두들 뛰어놀기 좋은 곧 동네 운동장으로 되었다
그곳마저 나중에 집이 지어졌고 교회를 비롯하여 몇채의 건물이 세워졌으니 아마 그때가 시골 부용이 한창때였지 않았나 생각한다
동네는 항상 시끌벅적 했었는데 장터 주위에 사는 친구들이 모두 나와 다져진 밭과 골목 길에서 자치기, 딱지치기, 구슬치기 하느라 조용할 날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옆집 낙희, 영순, 영준, 영숙, 영식 또 반대쪽 집 맹순, 순근, 정근, 옥근, 점근, 점순 우리 집 다섯 남매와 부모를 합치면 세 초가집만 하여도 22명이 살았다
그때는 동네 대부분이 한 집에 일곱, 여덟식구 였었으니까 . .
그 근방 동네 애들을 합하면 금방 50 ~ 60명이 되며 집안에서는 다른 마땅한 놀이가 없었을 때였다
동생이 태어나면 등에 업어 키우고, 손잡고 데리고 다니며 함께 놀아주고, 커서 학생이 되면 벌어서 학비도 대주었다
바야흐로 세월이 흘러 이제 보통 자녀수가 5~10명이 2명으로, 졸업할 때 6학년 135명이던 초등학교가 학생 전부가 21명으로 쪼그라 들었으며 시골 부용이 약국조차 없는 곳으로 변해버렸다
장이 섰을 때 동네 장터에서 물건을 팔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집의 기억들이 떠오른다
한쪽 탱자나무길로 조금 들어가면 두부장수 집이 있었다
집에서 두부를 빚어 동네를 돌아 다니며 팔았던 아저씨는 옛날 두부장수 모습으로 한쪽 어깨에 기다란 막대기를 메고 막대 앞, 뒤 끝에 끈으로 매달은 넓적한 상자판에 두부를 담아 땡그렁 땡그렁 손 종을 울리면서 여러 동네를 돌아 다녔었다
그 두부장수 아저씨 한손이 주먹손 이었기 때문에 근방 사람들은 누군지 쉽게 알아 볼 것이라 생각한다
긴 막대 끝에 늘어뜨린 두부판을 어깨에 지고 다니니 꽤 힘이 들었을텐데 다 팔기 위하여 손종을 울리면서 부용 관내와 조금 먼 공덕면 황산까지도 갔었다고 한다
두부를 만들때 나오는 비지는 그냥 버렸는데 우리는 가끔 그 비지를 받아와 돼지 밥을 줬으며 국을 만들어 먹기도 하였고 멀국이 꽤 맛있었다
우리 동네에는 두부 만드는 집이 한곳 더 있었으며 언젠가 부터 그런 모습으로 어깨 위에 짊어지고 물건을 팔러 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찾아 볼 수가 없다
두부장수 집마당을 지나서 더 들어가면 신작로에서 고기 판매를 하며 돼지를 집에서 잡는 집이 있었다
집 입구 노천 부위가 돼지잡는 장소로 돼지를 잡는 날이면 지르는 꽥 - 꽥 소리가 동네에 울려 퍼지고 우리집까지 들려왔다
그집 둘째 아들이 동네 골목대장이며 남매로 오복, 오봉, 옥주, 옥련이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누나 동창으로 친구였고 어릴 때 나도 그집 식구와 함께 놀았으며 약간 어두운 그집 방안에 들어 간 기억이 나는것으로 보아 아마 새배드리러 간 것 같다
돼지를 잡고 있을 때는 "돼지 멱 따는 소리"라고 하는 그 소리가 온 동네를 떠들석하게 했어도 동네 사람 누구도 시끄럽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
신작로에서 고기장사를 하려고 잡는 것이며 그 집 형제들은 덩치가 크고 억세며 마음씨는 좋았으나 좀 사나운 인상을 주는 그집 어머니한테 누구도 대들지는 못한것 같다
돼지를 사올 때는 다 커서 엄청나게 큰 돼지를 묶어서 짐 자전거 뒤에 사진처럼 싣고 왔었다
싣고 오는 도중에 계속 꽥꽥 거렸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100근(60kg)이 훨씬 넘는 무거운 돼지를 그냥 조용히 싣고 오는 것을 가끔 보았고 힘이 다빠져서 그러는지 그냥 간헐적으로 "꿀꿀" 소리만 냈다
요즘 같으면 그렇게 자전거에 돼지를 싣고 다니거나, 돼지 잡을 때 나는 꽥꽥 소리는 동물을 학대한다고, 소음 발생으로 진즉 고발되었을 터인데 이제 옛날 이야기로 되어 버렸다
그 당시 돼지를 싣고 다니던 짐 자전거는 앞 핸들 부위를 튼튼하게 보강하여 나중에 150kg 까지 실을 수 있는 것도 만들었다고 하며 주로 쌀집에서 많이 이용하였고 80kg 쌀 두가마니, 아니 세가마니, 이는 어른 세명 이상의 무게도 실을 수 있는 짐꾼들이 있었다고 한다. 믿거나 말거나 . .
또한 주장집에서는 짐 자전거를 막걸리 배달하는데 주로 이용하였으며 뒤에 한번에 술통을 8개를 싣고서 동네 구석을 눈비가 와도 진흙길에서도 달렸었다
오르막 길은 페달을 밟는게 무지막지하게 힘이 들어 내려서 밀고 가야 했는데 힘이 좋고 숙련이 잘된 어른들만이 가능했다
내리막은 브레이크를 꽉 잡은채 조심조심 내려와야 했으며 브레이크 잡는 소리가 삐 - 익, 삑 들려 왔었다
당시 구루마와 함께 짐 자점거는 무거운 것을 실어 나르는데 활약을 많이 했었으며 쌀은 80 kg → 40 kg → 20 kg 단위로, 막걸리는 한통이 한병 작은 단위로 줄어 들고 그와 함께 경운기나 소형 트럭이 대신하면서 부터 짐 자전거는 이제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낙네는 출렁거리는 양철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농부들은 어깨에 나락을 잔뜩 실은 지게를 짊어지고, 술통을 가득 실은 짐 자전거는 수렁길을 이겨내고, 어깨가 아파도 두부가 다 팔릴 때까지 참고, 동네가 멱따는 소리로 소란스러워도 그런 소리를 그냥 참으며 살아 온 인고의 세월이 있었기에 오늘날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들의 어린시절 모습이 호랑이 담배먹던 시절의 이야기가 되었으며 그러면서 모두들 함께 오늘 또 한살 나이를 더 먹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