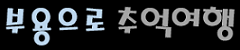백제문화
페이지 정보

본문
오래 전 백제와 형제 나라였던 일본은 나당연합군에 의하여 멸망한 백제의 수복을 위하여 군대를 보내 왔지만 금강 하구에서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그러나 백제와 교류를 많이 했고 일본 천황과 친족관계였으며 불교와 학문, 기술을 전파하였는데 그래선지 우리와 말하는 순서와 한자 단어가 같은 유일한 나라이며 지금도 일본 나라시에는 그 흔적들이 아직 남아 있다
이후 일본은 섬 안에서 각 지역 주 인끼리 칼로 서로 다투며 한자를 그대로 쓰면서 ‘가나‘라는 글자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의 영향을 계속 받아 왔고 한자를 쓰면서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만들어 백성들이 사용하게 했다
훈민정음을 만들면서 ‘중국과는 달라 서로 사맛디 아니할세’ 라고 하였는데, 같은 한자를 쓰고 있었는데 뭐가 달랐을까 ? 하고 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말이 우리와 순서가 다른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세종대왕이 만들 때 말 순서가 다른 것 보다는 그때 우리가 사용하던 어떤 말들이 있었는데 그 말이 중국과는 달라 새로 만들면서 그것들을 잘 정리하고 체계를 확립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또한 만든 글자는 쉬워 지혜로운 자는 하루 만에 배울 수 있고 바람 소리나 동물의 소리도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 .
그 말처럼 한글로 동물의 울음소리 즉, 꼬끼요우, 꾀꼴꾀꼴, 꺽꺽, 꿀꿀, 뻑꾹뻑꾹, 쫑쫑 . . 자동차 소리 빵빵이나 꽉, 꽝, 꽈당, 꿀꺽, 딸깍 등 표현할 수 있는 의성어는 영어 등 세계 어떤 언어도 제대로 구현할 수 없는, 글로서 실제 소리와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의 뛰어난 장점이기도 하다
그것은 영어, 일본어 등 외국어는 단어 맨 앞 글자가 aa, bb, ぁぁ, かか 등 특히, 자음 겹글자를 거의 쓰지 않는데 반하여, 우리말은 그게 쉬우며 나아가 그러한 된소리 표현을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깐, 깨, 껌, 꿈, 떡, 떵, 뽕, 썰, 쩍, 쪽, 쫑 . .
한편 우리가 살던 지역의 사투리가 그런 억센 된소리 발음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말들을 순화시켜 표준말을 만든 것 같기도 하다
꼬랑(꼬랑창) → 고랑, 또랑 → 도랑, 뻔데기 → 번데기, 뚜부 → 두부, 꼬추장 → 고추장, 빠짝 → 바짝, 쪼끔 → 조금, 쌩 → 생(고구마) . .
‘고추’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 약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꼬치 → 꼬추 → 고추
땡기다 → 당기다, 꺼멓다 → 거멓다, 뿌쉬다 → 부시다 . .
경상도 사람들이 발음을 잘 하지 못하는 '쌀' → '살'을 쉬운 예로 들 수 있겠다
세종대왕이 우리 지역에서 사용하던 된소리 말을 잘 정리하여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렇게 만든 말을 우리가 살던 지역에서 더 잘 활용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충남 서산, 태안에서도 우들이 → 우리들이, 어덕 → 언덕 등의 비슷한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억양도 비슷한 것으로 보아 그쪽 지방도 우리와 같은 백제 문화권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다
그 옛날 곡창지대에서 생산된 무거운 쌀가마니는 이동하기 편리한 배를 이용하여 강과 바다를 통행하며 가까운 지역간 교류를 했을 것이라 생각해 본다
아침 TV 방영되는 충남 서천의 오일장을 취재에서도 비슷한 느낌이 오는, 우리가 잘 사용하던 말 그래요, 했네요 등의 끝부분이 약간 높은 억양 발음을 들을 수 있었는데 . .
아무래도 좀 거시기 하기는 하지만 그쪽 지역까지 포함하여 아직도 남아있는 언어 습관을 근거로 그 근방을 백제 문화권으로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백제와 교류를 많이 했고 일본 천황과 친족관계였으며 불교와 학문, 기술을 전파하였는데 그래선지 우리와 말하는 순서와 한자 단어가 같은 유일한 나라이며 지금도 일본 나라시에는 그 흔적들이 아직 남아 있다
이후 일본은 섬 안에서 각 지역 주 인끼리 칼로 서로 다투며 한자를 그대로 쓰면서 ‘가나‘라는 글자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의 영향을 계속 받아 왔고 한자를 쓰면서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만들어 백성들이 사용하게 했다
훈민정음을 만들면서 ‘중국과는 달라 서로 사맛디 아니할세’ 라고 하였는데, 같은 한자를 쓰고 있었는데 뭐가 달랐을까 ? 하고 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말이 우리와 순서가 다른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세종대왕이 만들 때 말 순서가 다른 것 보다는 그때 우리가 사용하던 어떤 말들이 있었는데 그 말이 중국과는 달라 새로 만들면서 그것들을 잘 정리하고 체계를 확립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또한 만든 글자는 쉬워 지혜로운 자는 하루 만에 배울 수 있고 바람 소리나 동물의 소리도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 .
그 말처럼 한글로 동물의 울음소리 즉, 꼬끼요우, 꾀꼴꾀꼴, 꺽꺽, 꿀꿀, 뻑꾹뻑꾹, 쫑쫑 . . 자동차 소리 빵빵이나 꽉, 꽝, 꽈당, 꿀꺽, 딸깍 등 표현할 수 있는 의성어는 영어 등 세계 어떤 언어도 제대로 구현할 수 없는, 글로서 실제 소리와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의 뛰어난 장점이기도 하다
그것은 영어, 일본어 등 외국어는 단어 맨 앞 글자가 aa, bb, ぁぁ, かか 등 특히, 자음 겹글자를 거의 쓰지 않는데 반하여, 우리말은 그게 쉬우며 나아가 그러한 된소리 표현을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깐, 깨, 껌, 꿈, 떡, 떵, 뽕, 썰, 쩍, 쪽, 쫑 . .
한편 우리가 살던 지역의 사투리가 그런 억센 된소리 발음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말들을 순화시켜 표준말을 만든 것 같기도 하다
꼬랑(꼬랑창) → 고랑, 또랑 → 도랑, 뻔데기 → 번데기, 뚜부 → 두부, 꼬추장 → 고추장, 빠짝 → 바짝, 쪼끔 → 조금, 쌩 → 생(고구마) . .
‘고추’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 약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꼬치 → 꼬추 → 고추
땡기다 → 당기다, 꺼멓다 → 거멓다, 뿌쉬다 → 부시다 . .
경상도 사람들이 발음을 잘 하지 못하는 '쌀' → '살'을 쉬운 예로 들 수 있겠다
세종대왕이 우리 지역에서 사용하던 된소리 말을 잘 정리하여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렇게 만든 말을 우리가 살던 지역에서 더 잘 활용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충남 서산, 태안에서도 우들이 → 우리들이, 어덕 → 언덕 등의 비슷한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억양도 비슷한 것으로 보아 그쪽 지방도 우리와 같은 백제 문화권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다
그 옛날 곡창지대에서 생산된 무거운 쌀가마니는 이동하기 편리한 배를 이용하여 강과 바다를 통행하며 가까운 지역간 교류를 했을 것이라 생각해 본다
아침 TV 방영되는 충남 서천의 오일장을 취재에서도 비슷한 느낌이 오는, 우리가 잘 사용하던 말 그래요, 했네요 등의 끝부분이 약간 높은 억양 발음을 들을 수 있었는데 . .
아무래도 좀 거시기 하기는 하지만 그쪽 지역까지 포함하여 아직도 남아있는 언어 습관을 근거로 그 근방을 백제 문화권으로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 이전글소설가 박범신과 만남 25.04.27
- 다음글옛날 사랑이야기 (번역 패러디) 25.02.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